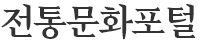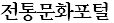한문화
[황광해의 한식읽기] 36. 우거지와 시래기
배추 우거지, 무청 시래기라는 표현은 귀에 익다. 우거지, 시래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배추 우거지’ ‘무청 시래기’는 자주 듣는다.
우거지와 시래기. 넓고 깊은 의미를 지닌다. 무, 배추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단순히 시래기는 무청, 우거지는 배추가 아니다. 우거지와 시래기는 한식의 큰 바탕이다. 한식의 특질 중 하나인 나물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거지와 시래기다. 우거지와 시래기는 한두 종류가 아니다. 수백 종류 산나물, 들나물에 모두 우거지, 시래기가 있다.
우거지와 시래기. 넓고 깊은 의미를 지닌다. 무, 배추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단순히 시래기는 무청, 우거지는 배추가 아니다. 우거지와 시래기는 한식의 큰 바탕이다. 한식의 특질 중 하나인 나물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거지와 시래기다. 우거지와 시래기는 한두 종류가 아니다. 수백 종류 산나물, 들나물에 모두 우거지, 시래기가 있다.
우거지는 ‘웃 걷이’에서 비롯된 말이다. 채소, 푸성귀의 위, 바깥의 먼저 자란 부분, 웃자란 부분이다. 위, 바깥에서 걷어냈다고 ‘웃 걷이’고, 우거지가 되었다.
우거지가 푸성귀의 바깥, 윗부분을 가리킨다면, 시래기는 다르다. 시래기는 푸성귀 말린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지금보다 채소를 귀히 여겼다. 제사에도 늘 사용했다. 한두 가지만 쓴 것도 아니고, 조리방식도 단순하지 않았다. 채소는 생채(生菜), 숙채(熟菜), 침채(沈菜) 혹은 초채(醋菜)로 나눈다. 생채는 날채소, 숙채는 익힌 것이다. 숙채는 삶거나 데친 것들 혹은 볶은 것들이다. 침채는 액체에 담근 것이니 장아찌, 김치 등을 이른다. 초채는 신맛이 나는 것이다. 침채와 초채는 비슷하다. 모두 삭혀서 신맛이 나는 것들이다.
시래기는 생채, 숙채, 초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말린 것이다. 건조한 후 일정 기간 보존했다가 먹는 나물이다. 우거지와도, 물론, 다르다.
우리는 흔히 우거지와 시래기도 혼동, 혼돈한다. 우거지와 시래기를 뒤섞는다. 우거지와 시래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가 있다. 시인 도종환의 시다. 제목은 ‘시래기’. (해인으로 가는 길, 2006년 발표)
저것은 맨 처음 어둔 땅을 뚫고 나온 잎들이다(중략)
가장 오래 세찬 바람맞으며 하루하루 낡아간 것도
저들이고 마침내 사람들이 고갱이만을 택하고 난 뒤
제일 먼저 버림받은 것도 저들이다
그나마 오래오래 푸르른 날들을 지켜온 저들을
기억하는 손에 의해 거두어져 겨울을 나다가(중략)
서리에 맞고 눈 맞아가며 견디고 있는 마지막 저 헌신(후략)
우거지와 시래기의 경계를 잘 보여준다. 시 중에 고갱이가 있다. 고갱이는 배추 등 푸성귀의 속대다. 노란 색깔이고 부드럽다. 국을 끓이면 단맛이 강하다. 서울의 해장국 집 중에는 배추속대를 넣고 끓인 ‘속대 해장국’을 별도로 내놓는 곳도 있다. 속대는 배추 우거지의 반대말 아닌 반대말이다. 배추 우거지는 가장 먼저 세상에 나온 것이다. 배추를 손질할 때, 가장 먼저 걷어내는 것이 바로 우거지다.
시의 뒷부분에 나오는 겨울을 나는, 서리와 눈을 맞으면서 견디고 있는 것은 시래기다. 우거지에 한겨울의 추위와 바람, 눈과 서리를 더하고, 시간이 흐르면 시래기가 된다.
시래기는 우거지 등을 삶거나 혹은 날것으로 말린 것이다. 한겨울 처마 밑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시래기다. 비, 눈, 바람, 서리를 모두 견딘다. 마르면서 서서히 발효, 숙성한다. 우리는 시래기를 말린다고 여기지 발효, 숙성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다. 시래기는 숙성, 발효한다. 시래기의 곰삭은 맛은 삭힘의 맛이다.
시래기는 얼마나 오래된 식재료일까?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우리 고유의 것이라고 여길 수도 없다. 우리도 푸성귀를 말려서 사용했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추운 계절이 되면 말린 푸성귀, 시래기를 먹었을 것이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 푸성귀는 숨을 거둔다. 봄, 여름, 가을까지, 들판과 산에는 푸성귀가 지천이다. 문제는 겨울이다. 늦가을, 배추, 무 등 재배한 푸성귀를 모두 수확한다. 겨울이면 들판은 빌 것이다. 늦가을, 가장 흔한 것이 배추, 무 등이다. 흔한 우거지로 시래기를 만든다. ‘우거지 해장국’은 우연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은 푸성귀에서 떨어진 우거지도 소중했다. 바로 끓이면 우거지 해장국이고, 말리면 우거지 시래기다.
시래기는 배추, 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모든 푸성귀를 말리면 시래기다. 산나물, 들나물도 마찬가지다. 겨울을 대비한다. 용재 성현(1439~1504년)의 “허백당집”에 실린 시 “신춘이수”의 한 부분이다.
겨울 넘긴 묵은 나물(旨蓄, 지축) 먹기가 괴로우니
병든 입에 깔끄러워 뱉으려다 삼키누나
봄이 오자 새로 나온 연한 나물 먹고파서
묵은 땅을 일구어서 순무 뿌리 심어 보네
시래기는 맛있어서 먹었던 식재료는 아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다. 용재같이 학문이 깊고 밝은 이도 봄철 연한 나물을 그리워한다. 누구든 한반도의 겨울이면 나물을 구할 수 없다. 우리는 나물이 없으면 끼니를 잇지 못하는 민족이다. 반드시 밥상에 나물이 있어야 한다. 용재 성현도 마찬가지였다.
시래기를 마냥 나쁘게 여기지도 않았다. 말려서 보관한 나물, 묵나물, 시래기를 ‘지축(旨蓄)’이라고 표현했다. 표현이 아름답다. ‘지(旨)’는 맛있다는 뜻이다. ‘축(蓄)’은 보관한다는 뜻이다. 지축은 ‘잘 보관한 맛있는 것’ 쯤 된다.
고려말, 조선 초를 살았던 양촌 권근(1352年~1409年)은 용재 성현보다 약 100년 전의 사람이다. 양촌의 문집 “양촌선생문집”에 실린 시 ‘축채(蓄菜)’다. 축채는 채소를 보관한다는 뜻이다. 겨울에 잘 보관한 채소가 바로 시래기다. 넓은 의미에서는 김치를 담그는 것도 마찬가지. 지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산나물, 들나물을 말린 시래기나 김장김치 모두 한겨울 채소를 잘 보관하는 방법이다.
시월이라 거센 바람 새벽 서리 내리니
울에 가꾼 소채 거두어들였네
맛있게 푸성귀 마련(旨蓄) 겨울에 대비하니
진수성찬 없어도 입맛이 절로 나네
시래기를 진수성찬에 비교했다. 시래기는 입맛이 나는 식재료다.
물론 시래기는 서민들의 먹을거리였다. 맛있든 말든,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시래기가 필요하다. 모든 푸성귀 말린 것은 곧 시래기다. 정월대보름의 묵나물도 마찬가지. 여러 종류 시래기 모둠 쟁반인 셈이다. 묵나물, 묵은 나물, 시래기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18년 9월의 기사다. 제목은 “양양도호부사 유자한이 강무(講武)의 연기를 상서하다”이다. 강무는 국왕이 참석하는 전술 훈련, 사냥 행사다.
물론 시래기는 서민들의 먹을거리였다. 맛있든 말든,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시래기가 필요하다. 모든 푸성귀 말린 것은 곧 시래기다. 정월대보름의 묵나물도 마찬가지. 여러 종류 시래기 모둠 쟁반인 셈이다. 묵나물, 묵은 나물, 시래기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18년 9월의 기사다. 제목은 “양양도호부사 유자한이 강무(講武)의 연기를 상서하다”이다. 강무는 국왕이 참석하는 전술 훈련, 사냥 행사다.
(전략) 신(臣)이 보건대, 강원도(江原道)는 (중략) 영서(嶺西)는 서리와 눈이 많고 (중략) 땅에 돌이 많아서 화곡(禾穀)이 번성하지 못하여, 풍년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이 오히려 지축(旨蓄)과 마, 밤으로 이어가고서야 겨우 한 해를 넘길 수 있으므로, 민간에서 상수리 수십 석(碩)을 저장한 자를 부잣집이라 합니다. 농부를 먹이는 것은 이것이 아니면 충족할 길이 없고, 백성이 이것을 줍는 것은 다만 9월ㆍ10월 사이일 뿐인데, 이제 순행(巡幸)이 마침 그때를 당하였으므로, 지공(支供)의 비용으로 백성을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꼴을 쌓고 행영(行營)을 닦는 것은 백성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후략)
강무가 있으면 인근 농민들은 국왕 일행의 잠자리와 식사, 시중에 동원된다. 강무가 가을에 있으면 인근 농민들이 겨우살이 준비를 하지 못한다.
화곡은 쌀을 비롯하여 수수, 보리, 조 등이다. 이른바 곡식이다. 이 일대에는 화곡이 거의 없다. 풍년이라도 산나물 말린 시래기[旨蓄, 지축]나 마, 밤으로 끼니를 잇는다.
용재 성현이나 양촌 권근은 고위직 사대부였다. 시래기를 겨울 반찬으로 여겼다. 가난한 산골의 백성들은 다르다. 없으면 굶을 판이다. 귀하고 목숨을 잇는 먹거리로 여겼다. ‘주식’에 가깝다. 시래기는 우리 곁에 오랫동안 있었다.
시래기, 우거지가 우리만의 것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먹었던 식재료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승, 발전시키고 있을 뿐이다. 양구 시래기나 각종 묵나물 문화는 우리 식문화의 독특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시래기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한낱 푸성귀라고 천대하지 않았다.
인터넷 중국어 사전 “바이두(BAIDU)”에도 지축(旨蓄)이 있다.
중국의 ‘지축’도 오래된 문화다. 시경에 “我有旨蓄,亦以御冬(야유지축 역이어동)”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지축을 준비했으니, 이 겨울도 또한 지나가리라”는 뜻이다. 지축, 시래기를 준비했으니 겨울이 와도 먹을 것이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시래기를 더 발전시키지 못했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지축, 시래기와 우리의 시래기는 다르다. 뿌리는 같다. 겨울을 준비하여 마련한 마른 푸성귀다. 긴 역사 동안 발전, 변화한 모습은 다르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산나물, 들나물을 우거지, 시래기 형태로 먹는다. 일 년 내내 푸른 푸성귀가 흔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묵나물을 먹는다. 시래기다.
조선 중기를 살았던 오음 윤두수(1533~1601년)는 “오음잡설”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고봉 기대승(1527~1572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고봉 기대승의 우거지, 시래기’다.
기고봉의 서실(書室)이 호현방(好賢坊) 골목에 있었는데,
일찍이 봄철에 종을 보내어 용문산(龍門山)의 산나물을 뜯어다가
뜰에서 말려 월동 준비를 하였으니, 즉 《시경(詩經)》에 이른바,
‘내 아름다운 나물을 저축한다[我有旨蓄]’는 뜻이니,
일찍이 우엉 나물을 삶아서 나에게 보내면서 (후략)
대유(大儒) 기대승도 역시 시래기를 귀하게 여겼다. 고봉은 우리의 묵나물, 시래기와 중국 지축이 같은 것임을 보여준다. 시경에 등장했던 시래기는 중국에서는 드물다. 우리는 여전히 겨울이면 숱한 시래기나물을 찾는다. 글 중에 ‘우엉 나물’이 나온다. 고봉의 우엉 나물은 아마도 우엉 잎일 것이다. 우엉은 뿌리를 먹는 것이지만 고봉은 우엉 잎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우거지, 시래기를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사라진 나물도 많다. 이제는 보기 힘든 우엉 잎 나물도 마찬가지. 아마도 우엉 우거지였을 것이다.
한반도의 시래기, 우거지는 깊다. 정월대보름의 묵나물도 시래기다. 우리 곁에는 늘 시래기가 있었다.
필자 황광해는,
경향신문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했으며, 현재 음식 칼럼니스트로 활약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식을 위한 변명>, <고전에서 길어올린 한식이야기 식사>, <한국맛집 579> 등이 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이동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