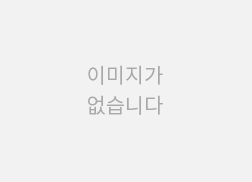전통백과
구들은 지독하게 추운 북녘에서 움집 바닥에 고래 켜고 난방하면서 생겼고, 마루는 고온다습한 남방에서 시원하게 살 수 있게 높은 나무에 집을 지으면서 생겼다.
한옥의 살림집은 북방에서 발전한 구들 드린 온돌방과 남방에서 비롯된 마루 깐 대청이 한 건물 내에 함께 있는 점이 대표적 특성이다. 폐쇄적인 온돌방과 개방적인 마루는 상반된 구조인데도 서로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존한다는 점이 놀라운데, 이는 북방문화와 남방문화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문화사적인 의의도 대단히 크다.
춥고 긴 겨울은 온돌방과 폐쇄성을 요구하며, 무덥고 긴 여름은 대청과 개방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들 두 공간은 창호의 독특한 구성으로 손쉽게 폐쇄적이고 개방적인 이중적 성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사찰의 경내(境內)에 진입할 때 일주문(一柱門)을 지나 다시 천왕문(天王門)을 통과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공간의 맛을 느끼고, 다시 넓은 마당에서 앞에 우뚝 선 누(樓)의 밑으로 난 좁은 공간을 만나게 되며, 이 좁은 공간을 지나 올라가면 넓은 대웅전(大雄殿) 마당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건축 부재(部材)의 끝 부분, 즉 창방(昌枋), 평방(平枋), 보 또는 기둥의 끝단에 머리초를 하고, 그 다음에 가칠단청이나 긋기단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머리초란 부재 끝에 여러 색으로 녹화(綠花), 연꽃, 석류(石榴) 등의 무늬를 그린 것을 말한다.
가칠단청(假漆丹靑)을 한 위에 먹이나 색으로 일정한 폭의 줄을 긋는 것을 말한다. 이때 먹으로 긋는 것을 먹긋기라 하는데, 보통 먹줄을 그은 후 가는 백선(白線)을 곁들이게 된다. 이때 이 백선을 백실이라 부른다. 다음 색줄을 긋는 것을 색긋기라 하는데, 색긋기는 단색 혹은 둘 이상의 색으로 긋는다. 이때도 가는 백실을 곁들이기도 한다. 긋기단청은 보통 직
가칠단청은 초록색[磊綠], 적갈색[石問朱], 백분[白粉], 황토[黃土] 등으로 칠하여 이 칠 자체가 바탕색이 되거나, 또는 다음에 말할 긋기단청, 모로단청 등의 바탕칠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종6품직(從六品職) 제조선화(提調善?), 종7품직에 선화(善?)를 두었다는 기록이나 홍인지문(興仁之門) 상량문(上梁文) 중에 ‘丹靑?師 金在德’이라 한 것은 단청이 건축의 축조술(築造術)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고려도경 제5 권 궁전 1 회경전(高麗圖經 第五卷 宮殿一會慶殿)에|會慶殿左?闕內東……東西兩階丹漆欄檻……飾以銅花交彩麗……|라고 한 것은 분명히 단청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런 단청이 조선시대에 그대로 계승되어 오늘날 각종 건축에서 고찰 가능한 단청의 여러 형태를 낳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