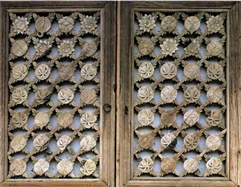전통백과
초석을 평평하게 다듬은 위 에 직선으로 자른 기둥을 올려놓는 정평주초 방식에 비해 덤벙주초 방식은 품도 많이 들고 까다로운 기술을 요한다. 그러나 초석과 기둥이 서로 이가 물리듯이 결구되기 때문에 기둥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힘에 대해 매우 견고한 구조법이다.
시각적 안정성은 곧 구조적 안정성이기도 하다. 기둥에 대한 몇 개의 대표적 인 기법들만 들어보자. 예의 배흘림과 함께 보편화된 것은 민흘림이다. 기둥의 밑둥을 크게 하고 위를 작게 하는 직선형 기둥이다. 이 역시 평행기둥이기를 포기했다. 배흘림기둥은 원래 나무의 상당부분을 깎아내야 하지만, 민흘림은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목재의 형상을 웅용한 가공법이기 때문
두 척도 사이의 차이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건물의 뒤로 돌아가 보라. 두 건물 모두 옆면과 뒷면을 이중 전돌벽으로 쌓아 육중한 모습이다 정전의 뒷면은 그야말로 100m의 길이를 연속으로 쌓은 벽돌벽이다. 그 무한한 길이에 질릴 정도다. 그러나 영녕전의 뒷면은 기둥을 노출시키고 기둥 사이만 벽돌벽을 쌓았다. 다시 말해서 긴 벽돌벽을 나무기둥들이 수평적
기념비적 척도를 얻기 위해서 정전이 취하고 있는 특별한 전략들이다. 태실이나 기둥의 처리와 같이 무한한 연속을 반복한다. 도대체 몇 칸인지 분간하기를 포기할 만큼 인간적 인식의 한계를 초월해버린다. 반면 영녕전의 매스는 6-4-6칸으로 분절되어 대략 크기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월대의 크기와 높이도 정전이 상대적으로 크다. 두 건물의 스케일을 실험
화방사 채진루에서는 좀 더 흐트러졌다. 주간이 같은 것을 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변에도 그 차이를 많이 두고 있지 않다. 넓은 주간은 작은 창문 세 개로, 좁은 주간은 큰 창문 두 개로 처리했다. 차이는 분명 있되 약화되어 있다. 절묘한 역보상이다. 역보상이란 주간의 폭과 창문의 폭을 각각 두 종류로 만든 뒤 서로 엇갈려 대응시켰다는 의미이다. 넓은 주간
한 쌍 내에서 해학적 어울림이 있기 때문에 반복은 지루하지 않다. 율동은 다양하게 읽힌다. 중앙과 측면을 굳이 분별하고 싶다면 율동은 ‘a-bba’ 가 된다. 분별을 지우고 쌍의 반복으로 본다면 율동은 ‘ab-ab’ 가 된다.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는 보는 사람 마음이다. 그러나 정답은 후자에 가깝다. 계단이 단서이다. 정면의 다섯 주간에 세 개의 계단이 대